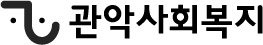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우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주랑남 작성일25-09-13 21:3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40.bog2.top
0회 연결
http://40.bog2.top
0회 연결
-
 http://63.yadongkorea.help
0회 연결
http://63.yadongkorea.help
0회 연결
본문
김환기 '항아리', 1958,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62x39cm. 학고재 제공
흙에는 모든 색이 들어 있다. 조선의 도공부터 오늘날의 화가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예술가들은 자연을 팔레트 삼아 가장 한국적인 색을 피워냈다. 서울 소격동 학고재에서 열리고 있는 그룹전 ‘흙으로부터’는 이런 한국 미감의 맥을 짚어보는 자리다. 조선시대 도자기에서 출발해 김환기, 송현숙, 박영하, 이진용, 박광수, 로와정, 지근욱 등 한국 화단을 일군 신구세대 작가 7팀이 흙의 물성과 개념을 탐색한 작품을 선보였다.
본관 전시장엔 새까만 흑자편호(黑瓷扁壺) 하나가 놓였다. 15~16세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초기부터 조선 양귀비게임설명
말까지 오랜 세월 쓰인 이 항아리가 품은 특유의 검은 빛은 철분이 다량 함유된 유약을 칠해 만들었다. 그 위에 한국 근대화단의 거장 김환기의 ‘항아리’가 걸렸다. 흔히 달항아리라 부르는 은은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백자대호(白磁大壺)를 그린 작품이다. 깊은 밤하늘 위에 뜬 둥그런 달의 모습처럼 흑자와 백자 그림이 제법 조화롭다. 푸른빛이 돌아 시린 느낌마저 투자할만한종목
드는 백색과 심연처럼 깊은 흑색의 조응은 마치 만물의 근원을 상징하는 흑백태극을 보는 듯 하다.
흑자편호, 15-16세기, 도자 Porcelain, 22x174x13cm. 학고재 제공
전시장 한쪽에 놓인 분청사기 ‘황금성3
분청자 초엽문편병’은 회색 태토 위에 하얀 백토를 입혀 거친 유약으로 마감했다. 하얗다고 하기엔 어딘가 오묘하다. 이와 한 쌍을 이루는 박영하의 ‘내일의 너’는 고대 원주민 미술에서 쓰인 천연 안료를 살려 화면 위에 거칠게 겹쳐 완성한 작품이다. 흙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보여주면서 거칠고 조악한 형태와 질감이 오히려 소박한 미학을 잘 드러내는 분청사기와야마토카지노
공명한다.
도자기를 그린 송현숙의 연작도 재밌다. 1970년대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건너간 그는 항아리나 횃대, 고무신, 명주실, 말뚝 같은 전통적인 사물을 화폭에 담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한쪽 벽면을 수놓은 거대한 설치작품인 이진용의 ‘컨티뉴엄’은 압도적이다. 수천 개의 활자가 모여 독특한 문양을 이루는데, 목판활자를 활용증권거래수수료싼곳
해 한 땀씩 정성을 들여 만든 작품이다. 이렇듯 본관 전시는 흙으로 직접 빚어낸 도자기부터 고향의 정취 또는 작은 입자 하나가 모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모습 등 흙에서 연상할 수 있는 정서를 담은 회화와 설치로 이어지는 식이다.
박광수 '땅과 화살'(2025). /학고재 제공
신관에는 30~40대 작가들의 젊은 작품들이 걸렸다. 흙 자체를 드러내기보단, 흙이라는 물질에서 출발하는 개념적 확장에 주안점을 둔다. 박광수의 작품에서 흙은 존재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자연의 얼굴도 있다. 전시에 나온 작품 ‘땅과 화살’은 소용돌이치는 붉고 푸른 강렬한 색감이 어우러진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릿해진 이 속에서 인간 역시 자연과 하나가 되며 소멸과 탄생의 순간을 보여준다. 지근욱은 색연필로 선 긋기를 반복해 완성한 추상회화 ‘스페이스 엔진’ 연작을 통해 땅이 붙잡는 중력에서 해방된 입자가 빛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포착했다. 흙이 광물과 미네랄의 입자라는 생각에서 출발해 상상력의 범위를 넓히며 나온 결과물이란 점이 흥미롭다.
학고재 관계자는 “흙을 따라 전통과 현대, 물질과 정신, 기억과 감각 사이 연속성을 하나의 장에 펼쳐보고자 했다”며 “흙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듯 한국성 역시 시대와 맥락 속에서 유연하게 변주되는 개념임을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는 13일 폐막 예정인 전시는 관객 요청으로 오는 20일까지 연장했다.
유승목 기자
흙에는 모든 색이 들어 있다. 조선의 도공부터 오늘날의 화가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예술가들은 자연을 팔레트 삼아 가장 한국적인 색을 피워냈다. 서울 소격동 학고재에서 열리고 있는 그룹전 ‘흙으로부터’는 이런 한국 미감의 맥을 짚어보는 자리다. 조선시대 도자기에서 출발해 김환기, 송현숙, 박영하, 이진용, 박광수, 로와정, 지근욱 등 한국 화단을 일군 신구세대 작가 7팀이 흙의 물성과 개념을 탐색한 작품을 선보였다.
본관 전시장엔 새까만 흑자편호(黑瓷扁壺) 하나가 놓였다. 15~16세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초기부터 조선 양귀비게임설명
말까지 오랜 세월 쓰인 이 항아리가 품은 특유의 검은 빛은 철분이 다량 함유된 유약을 칠해 만들었다. 그 위에 한국 근대화단의 거장 김환기의 ‘항아리’가 걸렸다. 흔히 달항아리라 부르는 은은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백자대호(白磁大壺)를 그린 작품이다. 깊은 밤하늘 위에 뜬 둥그런 달의 모습처럼 흑자와 백자 그림이 제법 조화롭다. 푸른빛이 돌아 시린 느낌마저 투자할만한종목
드는 백색과 심연처럼 깊은 흑색의 조응은 마치 만물의 근원을 상징하는 흑백태극을 보는 듯 하다.
흑자편호, 15-16세기, 도자 Porcelain, 22x174x13cm. 학고재 제공
전시장 한쪽에 놓인 분청사기 ‘황금성3
분청자 초엽문편병’은 회색 태토 위에 하얀 백토를 입혀 거친 유약으로 마감했다. 하얗다고 하기엔 어딘가 오묘하다. 이와 한 쌍을 이루는 박영하의 ‘내일의 너’는 고대 원주민 미술에서 쓰인 천연 안료를 살려 화면 위에 거칠게 겹쳐 완성한 작품이다. 흙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보여주면서 거칠고 조악한 형태와 질감이 오히려 소박한 미학을 잘 드러내는 분청사기와야마토카지노
공명한다.
도자기를 그린 송현숙의 연작도 재밌다. 1970년대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건너간 그는 항아리나 횃대, 고무신, 명주실, 말뚝 같은 전통적인 사물을 화폭에 담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한쪽 벽면을 수놓은 거대한 설치작품인 이진용의 ‘컨티뉴엄’은 압도적이다. 수천 개의 활자가 모여 독특한 문양을 이루는데, 목판활자를 활용증권거래수수료싼곳
해 한 땀씩 정성을 들여 만든 작품이다. 이렇듯 본관 전시는 흙으로 직접 빚어낸 도자기부터 고향의 정취 또는 작은 입자 하나가 모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모습 등 흙에서 연상할 수 있는 정서를 담은 회화와 설치로 이어지는 식이다.
박광수 '땅과 화살'(2025). /학고재 제공
신관에는 30~40대 작가들의 젊은 작품들이 걸렸다. 흙 자체를 드러내기보단, 흙이라는 물질에서 출발하는 개념적 확장에 주안점을 둔다. 박광수의 작품에서 흙은 존재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자연의 얼굴도 있다. 전시에 나온 작품 ‘땅과 화살’은 소용돌이치는 붉고 푸른 강렬한 색감이 어우러진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릿해진 이 속에서 인간 역시 자연과 하나가 되며 소멸과 탄생의 순간을 보여준다. 지근욱은 색연필로 선 긋기를 반복해 완성한 추상회화 ‘스페이스 엔진’ 연작을 통해 땅이 붙잡는 중력에서 해방된 입자가 빛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포착했다. 흙이 광물과 미네랄의 입자라는 생각에서 출발해 상상력의 범위를 넓히며 나온 결과물이란 점이 흥미롭다.
학고재 관계자는 “흙을 따라 전통과 현대, 물질과 정신, 기억과 감각 사이 연속성을 하나의 장에 펼쳐보고자 했다”며 “흙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듯 한국성 역시 시대와 맥락 속에서 유연하게 변주되는 개념임을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는 13일 폐막 예정인 전시는 관객 요청으로 오는 20일까지 연장했다.
유승목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